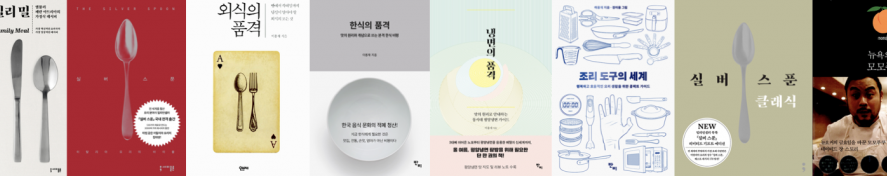뉴진스
꽤 오랫동안 생각해왔다. 나는 뉴진스가 힘들다. 싫거나 미운 감정과는 조금 다르다. 그들을 보고 있으면 가슴 저 깊숙한 곳에서 피로감이 밀려온다. 실제로 나는 그들이 등장한 뒤 아이돌, 좀 더 정확하게는 걸그룹에 대한 관심을 끊었다. 데뷔곡인 ‘어텐션’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노라니 내 안에서 무엇인가 깨지는 느낌이 들었다.
2015년부터 대략 그들이 데뷔할 때까지의 5-6년 동안 나는 걸그룹을 꽤 좋아했다. 기억에 의존해서만 쓰자면 트와이스는 데뷔 직후 활기찬 이미지에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곡을 대략 예닐곱 곡 혹은 그 이상 연속 히트시켰으며 ‘비밀 정원’으로 오마이걸을 알게 되어 ‘클로저’나 ‘한 발짝 두 발짝’ 같은 곡들까지 역주행했다. 여자친구는 의외로 ‘밤’이나 ‘메모리아’ 같은 중후기 곡이 좋았다.
그러다가 뉴진스가 등장하면서 갑자기 모든 관심이 다 사그라들고 이후 관심이 없어져 버렸다. 이유가 없는 건 아니다. 트와이스는 이후 곡들이 그저 그런 가운데 안무만 복잡해지는 느낌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박진영이 ‘성인식’으로 박지윤의 이미지 변신을 시도한 느낌과 너무 비슷해보여 관심이 사그라들었다(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오마이걸은 영문을 전혀 모르겠지만 ‘리얼 러브’ 같은 임팩트 없는 곡으로 2연속 활동을 시도해 ‘던던댄스’와 의외의 수록곡이자 후크송 ‘돌핀’의 히트와 ‘퀸덤’의 모멘텀을 다 까먹었다. 지호가 빠진 후 6인조는 뭔가 허전했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우여곡절 끝에 재결성했지만 적어도 나는 관심이 없어졌다. 첨언하자면 멤버들의 솔로 활동은 전부 안타까울 정도로 처참한 실패라고 생각한다. 특히 유주의 데뷔곡은 장점을 전혀 살려준다고 보지 못했기에 보다가 울었다.
이렇게 한때 직캠까지 찾아보던 나는 이제 아무런 걸그룹 컨텐츠도 가까이하지 않는다.
대체 나는 왜 뉴진스를 보고 그렇게 되었을까? 나는 대체로 너무 싫거나 너무 좋은 것이 생겨버리면 그냥 두지 않고 계속 파고들어가 본다.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감정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고 싶어한다. 그래서 뉴진스를 향한 감정도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 보았는데 그냥 계속해서 피로해질 뿐이었다. 잘하기는 너무 잘한다. 완벽에 가깝게 잘하는데 그 완벽에 가까운 느낌 혹은 완벽하면 비인간적이라 안된다는 느낌마저 고도의 학습 혹은 연습을 통해 만들어진 것 같아서 피로를 느꼈다고 말하면 설득력이 있으려나? 없어도 사실 상관 없다.
그들이 어른이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한 아이들이다 어쩌구 그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니다. 그것도 자기들 생각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그런 경지에 올라설 수 있다. 그렇다, 분명히 엄청난 경지에 오르기는 올랐는데 그 경지가 나에겐 너무 힘들다. 어떻게 깎아서 저렇게 만들었는지 알 것도 같고, 아예 나같은 범인은 그것마저도 짐작을 할 수 없게금 깎아 놓은 것 같기도 하다. 거듭 말하지만 이것은 호오의 감정과는 조금 다르다. 말하자면 연예인을 놓고 이런 감정을 느껴보기는 처음이고, 그 감정이 그들이 더욱더 다듬어지고 큰 인기를 누릴 수록 더해가는 것 같아 나도 어리둥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또 민희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난 언제나 한국 연예계 특히 아이돌을 필두로 한 음악계의 ‘레퍼런스’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어떻게 통하는지 늘 궁금하다. 나에게는 이것이 무수히 많은 비늘로 이루어진 껍데기처럼 다가온다. 대상을 다른 형체로도 만들어주고 보호도 시켜준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것이 하나의 생물에서 온 비늘이 아니다. 무수히 많은 생물, 심지어 원래 비늘이 없는 동물은 물론 식물로부터 와서 원천을 정확하게 헤아릴 수가 없다. 이런 비늘로 이루어진 껍데기를 쓴 이는 일시적으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탈바꿈은 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행일 수도 불행일 수도 있다.
완전 엉뚱한 “레퍼런스”가 하나 생각난다. 기억이 맞다면 원래 ‘우주소년 아톰’의 아톰은 최종 단계의 로봇이 아니다. 다음 단계로 가면 인간과 같은 표피(?)를 쓰고 형체를 바꿀 수 있는 로봇이 된다. 책은 안 보았고 TV의 만화영화에 의하면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아톰의 라이벌이 있는데 그가 이 기술을 어떻게 탈취해서 최종 단계로 진화한다. 그런데 곧 공격을 받고 팔다리가 잘려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다.
비참하게도 팔다리가 잘리는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음악을 포함한 연예계를 포함한 한국 사회에서 레퍼런스를 말할 때에는 늘 이런 장면들이 생각난다. 거의 아무도 원천을 파악하지 못할 만큼 덕지덕지 붙여서 일견 새로와 보이는 걸 만들어 내는 원동력 같은 것이다. 그러나 급할 때는 세절기로 가늘게 채친 지폐들도 다 붙여 복구를 해내듯 그 많은 레퍼런스의 비늘인지 껍데기도 뜯어보면 무엇인지 결국 보인다.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누군가의 시선만을 거친 껍데기일 뿐 체득을 거쳐 승화를 한 산물이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 확대해석하자면 현재 한국에서 팔리고 있는 전부가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