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와 한식 세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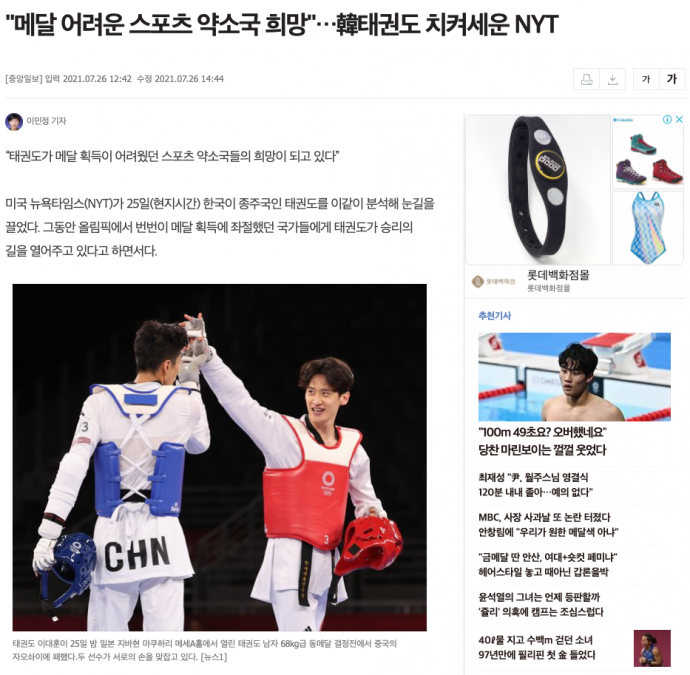
1986년, 수원 성균관대 체육관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태권도를 참관하러 갔었다. 초등 5학년이었고 태권도장에 다녔으므로 단체 참관을 했는데, 유일하게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못 따는 광경을 보았다.
35년이 지나 2021년, 한국은 태권도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만큼 태권도가 널리 퍼져 인구가 적고 올림픽에서 성과를 크게 거두지 못하는 국가에서도 입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진정한 세계화이고 한식도 이러한 길을 따라야 한다.
언제나 한식의 세계화는 ‘탑다운’과 ‘바틈업’의 접근 방식 양쪽 모두를 택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전자는 고급 음식과 파인 다이닝 위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후자는 치킨이나 순두부찌개를 위시한 대중적이고 동시대적인 음식 위주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다. 역시 늘 인용하기를 좋아하는 베누의 셰프 코리 리의 말을 빌자면 미국을 기준으로 작은 동네의 상가, 즉 스트립 몰 같은 데에 한식당 혹은 밥집이 들어서야 비로소 한식이 세계화 되었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러면 음식의 종류와 가격대에 상관 없이 한식이 널리 퍼져, 한국인이 아닌 요리사가 한국인보다 더 한식을 맛있게 잘 만드는 상황이 벌어져야 한다. 한식 요리 올림픽이라는 게 있다면 외국인 셰프가 1등을 차지할 수 있어야 하고, 서울에 외국인이 셰프를 맡는 한식당이 (정녕 필요하다면) 미슐랭 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세계인은 집합적인 개념 혹은 양식으로의 한식에 거듭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누군가는 이런 주장에 심기가 불편할 수 있겠지만, 마음 놓고 세계화 되었다는 요리 세계 혹은 음식은 이미 그런 현실을 누리고 있다. 우리는 서울에서 스시를 먹으면서 셰프가 반드시 일본인이어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는다. 빵은 어떤가? 아무도 프랑스의 불랑제가 구워야 맛있다고 믿지 않는다. 일본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서양의 양대 요리 세계를 흡수해서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었다.
선례는 한없이 다양하게 꼽을 수 있으니 한식은 그 길을 걷기만 하면 되고 우리, 아니 한국인 가운데 일부는 마음 속의 반감을 잠재우면 된다. 한식이 그런 방식으로 세계화 돼서 우리에게 나쁠 게 하나도 없다.
